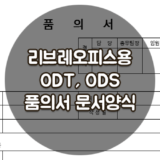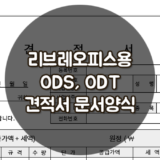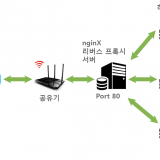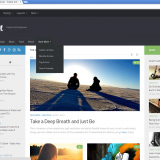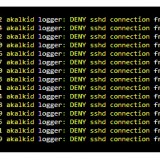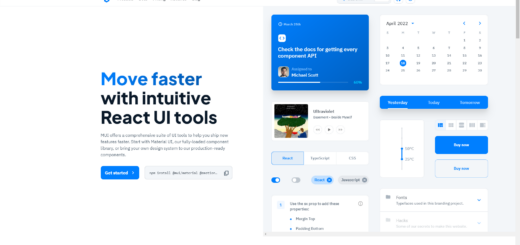“피끓는 청춘” 모호함의 결정판
나는 평소 영화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점수 배정을 고수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인 나도 좀 참을수 없는 영화가 있었으니…바로 박보영, 이종석 주연의 피끓는 청춘 되시겠다.
일단, 장르의 모호성부터 보자. 학원물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활극무협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코믹에 가까우면서도 코믹은 절대 아닌것 같고, 그렇다고 드라마도 아니다. 뭔가 4가지 장르를 다 담고 있기는 한데 확연한 한가지 장르가 없다. 모든걸 담아내려다 색깔이 없어진 경우가 아닐까 ?
어정쩡한 시대도 그렇다. 영화 “써니”의 경우는 정확히 80년대 초를 코믹을 섞어가며 사실감 넘치게 명확한 이미지를 그려냄으로써 30대 후반과 40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영화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80년대인지 명확히 분간이 가질 않는다. 60년대라면 이 영화에 쉽게 공감해줄 연령대로 너무 높아 극장가에서 초반 몰이가 쉽지 않을테고…그렇다고 7-80년대를 섞다보면 7-80년대 연령대에서도 영화를 보면서 그닥 큰 공감대가 형성되긴 쉽지 않을 터이다.
박보영, 이종석의 연기력은 볼만하다. 이종석은 촌티나는 ‘카사노바’ 혹은 촌빨 날리는 ‘바람남”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어설픈 매력과 학생적인 모습이 잘 어우러져 영화의 거의 모든 화면을 이종석이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박보영 역시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줬으나… 캐릭터가 가지는 한계 탓인지 시나리오에서부터 캐릭터를 애매하게 잡아놓은 것인지..
개인적으로 박보영 캐릭터는 ‘쳘벽의 피의 여제’ 이런 느낌이 나도록 남자도 쉽게 때려눕히는 진짜 짱! 이라는 형태의 애니적 요소가 가미되었어도 좋았겠다. 한 남자에 대한 여성의 매력을 간직한 ‘짱’ 이라는 설정은 매력적이면서도 왠지, 장면에 따라 쉽게 이해가 안가는 면들이…있었다. 게다가 캐릭터의 한계로 인해서 스크린의 내용들을 주도해 나가지도 못한다.
급조한 느낌이 드는 것은 개연성이 적은 연결부분들 때문일 것이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과장된 표현이야 ! 개인적 취향이라고 보면 될것인데…사건이나 결말과 진행에서 계속 되는 개연성의 부족은 사건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너무나 취약했다. 이런 저런, 이유와 사건을 만들면서 어찌어찌 영화는 끝을 내지만…끝내 끝에서도 코메디도 아니고, 무엇을 전달하여 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었다. 단지 그냥 웃기고 싶었나 ???!!!! 하아! 웃지 못한 내가 바보였던 것일까 ?
이건 ‘볼만한 영화’ 다. 그냥 볼만한 영화다. 재미를 찾거나 뭔가를 기대하고 보면 실망하기 딱 좋은… 그래서 그냥 볼만한 영화다. 집중력을 높여주지 못하는 주제에 런닝타임도 좀 긴편이다. 중간중간 지루함이 느껴져 집중력이 떨어진다 T-T;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2.5점 !!!
배우들의 연기력 때문에 그나마 후하게 점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